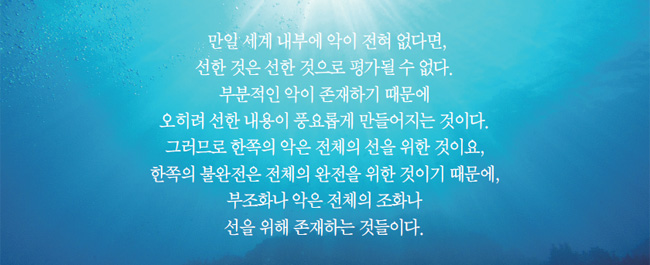천하를 얻었으나 지키는 법을 몰랐던 폭군 진시황秦始皇

*해와 달도 명만 내리면 운행을 멈추느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구릿골에 계시는데 한 성도가 아뢰기를 “옛날에 진시황(秦始皇)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에 돌을 채찍질하여 스스로 가게 하고, 밤의 잔치에는 흘러가는 시간을 아까워하여 지는 달을 꾸짖어 머물게 하였t다 하옵니다. 이것은 시황의 위세가 높고 커서 돌을 채찍질하고 달을 꾸짖는 권능을 가진 것 같았다는 것이니 후세에 지어낸 말이 아닙니까?” 하거늘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냐. 이제는 판이 크고 일이 복잡하여 가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권능이 아니면 능히 바로잡을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때 아침 해가 제비산 봉우리에 솟아오르거늘 상제님께서 해를 향하여 손으로 세 번 누르시며 “가지 말라!” 하시고
담뱃대에 담배를 세 번 갈아 천천히 빨아들이시니 문득 해가 멈추어 더 이상 솟아오르지 못하더라. (증산도 道典 4편 111장 1절~6절)
*운익이 돌아간 뒤에 성도들이 구월음의 뜻을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九月(구월)에 葬始皇於驪山下(장시황어여산하)라
구월에 진시황을 여산 아래에 장사하였다 하였으니 살지 못할 뜻을 표시함이로다.” (증산도 道典 9편 142장 10절)
* 전국 말세 진시황은 평천하 한 연후에
만리장성 높이 쌓고 돌사람을 만드느라 학정이 자심하매
상극사배(相剋司配) 선천 운수 갈수록 극렬했네.
(증산도 道典 11편 313장 7절 )
* 今日憶秦皇(금일억진황) 虎視傲東方(호시오동방) 진시황이 두 눈 부릅뜨고 진나라 동쪽을 노려보네.
一朝滅六國(일조멸육국) 功業蓋穹蒼(공업개궁창) 순식간에 여섯 나라를 멸하니 그 공이 하늘을 뒤덮었구나.
立志平天下(입지평천하) 西北驅虎狼(서북구호랑) 천하 평정에 뜻을 두고 서북 지역의 흉노를 격퇴하였네.
役民數十萬(역민수십만) 長城起邊疆(장성기변강) 수십만 백성의 힘으로 변경에 장성을 세웠구나.
欲尋不死藥(욕심불사약) 皇朝二世亡(황조이세망) 허나 불사의 선약에 미쳐 나라는 2대 만에 망하고 말았네.
不見始皇帝(불견시황제) 天地一蒼茫(천지일창망) 이제 시황제는 보이지 않고 천지만 드넓구나.
(懷古 옛일을 생각하며, 이태백)
BCE 11세기경 고대 중국에서는 주원周原 사람 무왕武王 희발姬發이 상商나라 제신帝辛, 주왕紂王을 멸하고 주周나라를 세웠다. 주나라는 자신의 영역을 여러 개의 영지로 나눠 왕실의 친척과 공신들에게 분배해 주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각 나라의 주군인 제후諸侯라 칭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받은 봉지의 정권을 잡고 이를 대대손손 세습하는 권리를 얻는 대신 주나라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했다.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업무를 보고하는 의무를 진 것이다. 또한 자신이 받은 영지를 다른 경대부들에게 분봉分封하기도 하는 이른바 봉건제封建制(Feudalism)를 실시했다. (역사적으로 봉건제는 주나라, 중세 유럽,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봉건제가 없이 일찍부터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 역사에 봉건제 운운하는 것은 마르크스 역사관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주나라는 12대 유왕幽王의 시대가 되었다. 유왕은 애첩인 포사褒姒의 환심을 사기 위해 봉화대에 불을 피워 제후들을 희롱한 고사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의 이런 행동은 제후들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조차 잃어 후일 실제로 위급한 지경에 처했을 때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후 유왕에 의해 폐위된 왕후 신후申后 일가는 서융西戎의 여러 부족 중 가장 강력한 견융犬戎과 연합하여 주나라 수도를 함락시켰고, 유왕은 결국 죽음을 맞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주나라는 12대 유왕幽王의 시대가 되었다. 유왕은 애첩인 포사褒姒의 환심을 사기 위해 봉화대에 불을 피워 제후들을 희롱한 고사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의 이런 행동은 제후들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조차 잃어 후일 실제로 위급한 지경에 처했을 때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후 유왕에 의해 폐위된 왕후 신후申后 일가는 서융西戎의 여러 부족 중 가장 강력한 견융犬戎과 연합하여 주나라 수도를 함락시켰고, 유왕은 결국 죽음을 맞았다.
이때 제후들은 태자 의구를 평왕平王으로 옹립하여 동쪽의 낙양으로 천도하였다. 역사에서는 이전을 서주西周로, 이후를 동주東周라고 구분한다. 동주시대는 다시 전반기인 춘추시대春秋時代와 후반기인 전국시대戰國時代로 나뉘며, 이 시기 주 왕실은 종주국으로서의 위력을 점차 상실해 갔다. 대신 각 지역의 제후국들은 저마다 세력을 키우기 위해 약육강식의 패권시대를 열었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司馬遷은 상대부上大夫 호수壺遂와 더불어 공자가 『춘추春秋』를 지은 까닭에 대해 논의하던 중, 『춘추』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춘추시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군주를 시해한 나라가 서른여섯, 멸망한 나라가 쉰둘, 제후가 도망쳐 달아나 사직을 유지하지 못한 나라는 셀 수도 없이 많았다.”
춘추시대 가장 힘이 강성했던 5대 강자를 일컬어 춘추오패春秋五霸라 부른다. 이 춘추오패는 나라 안팎으로 큰일이 있을 때마다 주변 제후국들을 단결시켜 안으로는 주 왕실을 보존하고 외적의 침략을 물리쳤다(존주양이尊周攘夷). 그러던 중 BCE 453년 강력한 패자였던 진晉나라가 한韓, 위魏, 조趙 세 나라로 분열된다(이 세 나라를 흔히 삼진三晉이라고 부른다). 분열된 이 해를 기점으로 학자들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눈다. 전국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주나라 왕에 대한 상징적 권위나 형식상의 명분마저도 사라져 버렸다. 저마다 왕이라 칭하고, 열국 간 전쟁의 규모와 내용이 더 격렬해졌다. ‘내가 너를 먹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먹히는’ 처절한 생존투쟁 현장이었다. 치열한 전쟁시대. 전국 7웅이라 불리는 강국들만 살아남아 이제는 통일의 그날만을 바라게 되었다.
주 평왕이 동쪽으로 천도할 당시 진秦 민족
(주1)
의 수장인 양공襄公은 군사를 이끌고 견융의 침략을 막고, 주 평왕을 호위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주 평왕은 진 양공을 제후에 봉하고 ‘기산岐山 서쪽의 땅’을 내렸으며 다른 제후들과 통혼하고 동맹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때는 BCE 770년경이다.
진나라 왕들의 성姓
(주2)
은 ‘영嬴’이며 넉넉하다는 뜻으로 이전 시대인 순임금 때 하사받았다. 양공 이후 9대손인 목공穆公은 오고대부五羖大夫(검은 색 수컷 양가죽 다섯 장이란 뜻으로 초나라에 붙잡힌 백리해의 가치를 알아본 목공은 일부러 낮은 가치인 양피 5장을 주고 백리해를 구해와 등용했다고 한다. 인재등용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백리해白里奚를 등용하여, 서쪽에서 뿌리를 내리며 나라의 힘을 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나라 영토의 대부분은 중원대륙 서북부 지역의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연안지역의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토대로 하는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전혀 존재감이 없고 사회발전 정도가 아주 낙후하였다. 중원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능력이나 문화수준, 군사력에서 변방의 미개하고 야만적인 국가에 불과했다. 특히 이웃한 진晉 나라와의 격차는 너무나 컸다. 그러나 이런 여러 약점들이 오히려 진나라에 의한 천하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
전한시대 사상가인 가의賈誼는 그의 유명한 시문詩文 ‘과진론過秦論’(진나라의 과실을 논함)에서 진나라의 천하통일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괜히 분쟁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어 다른 나라들과 잦은 전쟁에 휘말릴 염려도 없고, 저 멀리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매우 견고한 천혜의 요새를 갖추고 있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매우 유리하니 누구의 간섭 없이 장시간 국력을 축적할 수 있는 탁월한 지리적 요건을 지녔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역사가 짧고 문화적인 전통이 없었던 점이 오히려 새로운 정치실험을 가능케 하였고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제도를 통해 다른 나라 인재들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 나라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BCE 361년 진효공秦孝公은 선대왕인 목공이 이룬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나라 안팎으로 널리 인재를 구했다. 이때는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시점으로, 등용된 인물이 바로 공손앙公孫軮, 즉 상앙商鞅이었다(나중에 진왕으로부터 상商지역을 분봉받았기에 상앙이라고 불림). 공손앙은 낡은 법률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대대적인 개혁, 즉 변법變法을 주장하였다. 효공은 공손앙을 고위직에 앉히고 법률제도를 개정하였다.
이에 전권을 부여받은 공손앙은 연좌제, 신상필벌, 밀고를 장려하고 엄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하였다. 공손앙 변법의 목적은 진나라 자체를 삼엄한 법률체계에 의거한 전체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있었다. 공손앙의 변법은 큰 효과를 거두어 내정과 치안이 안정되고 산업이 크게 진흥되어 부국강병의 꿈이 이루어져 천하통일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훗날 진효공이 죽은 후 공손앙은 시기한 자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그가 이룬 업적이 물거품이 된 것은 아니었다. 진효공의 변법이 시행된 후부터 진시황이 6국을 통합하여 중원대륙을 통일하기까지는 6대
(주3)
에 걸친 노력이 있었다. 진시황은 6대에 걸친 선왕의 업적을 이어받아 긴 채찍을 휘둘러 말을 달리는 것처럼 천하를 다스렸다고 할 수 있다.
진나라의 급속한 세력 확장은 동방 제후국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중에서도 인접한 한, 위, 조 삼진은 더욱 강한 위협을 느꼈다. 진나라의 기세등등함에 여러 제후국들은 연합하여 진나라에 대항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때 나온 외교정책이 바로 합종연횡책合從連橫策이다.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동주東周 뤄양洛陽 사람인 소진蘇奏과 위魏나라 사람인 장의張儀이다.
소진은 진을 제외하고 종縱(남과 북)으로 연결되어 있던 6국의 연합에 주력한 합종책合縱策을 제시한 일종의 ‘상호 방위동맹’ 같은 것을 맺게 했다. 하지만 이는 각 제후들의 동상이몽과 장의의 연횡책連橫策에 의해 깨지게 되었다. 장의의 연횡책은 진나라가 6국 각각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진나라를 군주로 섬기게 하는 군신관계를 세우는데 힘을 쏟은 계책으로 진나라는 더욱 강성해졌고, 천하통일의 위업을 이룩하는데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 합종과 연횡은 정반대의 외교정책이지만, 따지고 보면 각각의 나라가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뭉쳤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정치적 술수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며, 천하통일이라는 대업을 향한 역사의 큰 흐름에서는 그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BCE 256년 진秦 소왕昭王 51년 진의 군사가 주 왕조를 멸망시켰다. 남아있던 주 왕실의 세력은 7년 뒤 진 장양왕莊襄王의 명을 받고 출진한 여불위呂不韋에 의해 멸망하였다. 진소왕은 위염魏冉(진 소왕 선태후의 아우로 진 소왕을 옹립하였고, 명장 백기白起를 기용한 공이 있다)을 등용해 내정을 안정시켰고, 탄력적인 외교술을 펼쳤다(원교근공 遠交近攻). 명장인 대장군 백기를 등용해 이궐 전투에서 20만 명의 한·위 연합군을 궤멸시켰고, 장평대전에서 조나라 40만 대군을 전멸시켰다. 천하대세는 이미 진나라로 넘어와 있었고, 6국 통일은 시간 문제였다.
13세의 소년 영정嬴政, 진나라의 왕이 되다
BCE 247년 중원대륙 서쪽 변방의 강국 진나라 장양왕 자이子異(성은 영嬴, 이름은 이異로 공자라는 의미로 자이라고 했고 초나라 출신의 화양부인의 양자가 되면서 초나라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자초子楚라고도 한다. 이하 익숙한 호칭인 자초라고 칭한다)가 죽었다.
진나라 왕들 가운데 재위 기간이 가장 길어 총 56년간 집권했던 진 소양왕昭襄王이 죽고 그의 아들 효문왕孝文王이 53세로 즉위했으나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으며, 그 아들 자초 역시 즉위한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4년 사이에 진나라 왕이 4명이나 바뀌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새로 즉위한 이는 자초의 13세 된 아들 영정嬴政이었다. 그가 중원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 바로 그 사람이다.
진왕 정政이 왕위에 등극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이는 바로 여불위呂不韋였다. 사실 진시황의 부친인 자초는 조부인 효문왕의 여러 공자 중 한 명이었다. 자초는 왕위 계승권을 가진 장자도, 쉽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막내둥이도 아니었다(이에 대해서 둘째 아들이라는 설도 있다). 자초의 생모인 하희夏姬 역시 크게 총애를 얻지 못했기에 당시 조나라에 인질로 잡혀 있던 상황이었다. 인질로 가게 되는 사람은 대개 왕실의 직계이지만, 왕실 내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자초를 진나라 왕으로 만든 이가 천하 대상인 여불위였다. 여불위는 양적陽翟(지금의 허난성河南省 우현禹縣)지방에서 태어난 거상이었다. 그는 축재에만 힘쓰는 다른 상인들과 달리 정치에 뜻을 두고 있었고, 그런 능력도 갖춘 비상한 인물이었다. 그는 상인 특유의 말로 “이 진귀한 물건(奇貨:자초를 두고 한 말)은 창고에 간직해 둘만하다(奇貨可居)”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거금을 자초에게 주어 조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게 했고, 값비싼 물건들을 들고 가서 당시 진나라 태자인 안국군이 총애하는 화양부인에게 접근하였다. 화양 부인은 초나라 출신으로 안국군 뒤를 이을 군왕의 자리를 잇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있었으나, 자기 소생의 아들은 없었기에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여불위는 화양부인과 정치적 거래를 하게 된다. 즉 자초가 화양부인의 양자가 되게 하여 안국군의 후계자가 됨과 함께 화양부인의 부귀영화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거래는 그대로 적중하여 후계자 지위를 얻은 자초의 앞길에는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사이 자초는 여불위의 경제적 후원을 받으며 제후들과 빈객들 사이에서 점차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훗날 진시황의 혈통에 얽힌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일어난다. 자초는 여불위의 애첩 조희趙姬를 아내로 맞아 들였고, BCE 259년 정월에 건장한 아들이 태어났다.
(주4)
정월에 태어났다 하여 이름을 정政이라 하였고, 조나라에서 태어났다 하여 조정趙政이라고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자초와 영정을 진나라 왕위에 오르게 한 여불위는 상국相國에 임명되어 국정을 보좌하였다. 진나라의 모든 군사와 정치 대권은 진왕 정이 친정親政하기 전까지 여불위 수중에 있었다. 여불위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내린다면 그가 집정 기간에 쌓은 업적은 상당히 훌륭하였고, 뒷날 진왕 정의 천하 통일 사업에 초석이 될 만하였다. 단지 진왕 정의 친정 이후에도 권력을 놓고 떠날 줄 몰랐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잠시 여불위의 업적을 살펴보는 건 진시황의 중원 통일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불위는 진 장양왕 원년 이름뿐인 동주를 멸망시켰다. 이어 전략적 요충지인 삼천군三川郡(황하黃河, 이하伊河, 낙하洛河 물줄기가 지나는 곳으로 동방 6국으로 향하는 관문에 해당한다)을 얻기도 하였다. 이 당시 진나라의 주 공격 대상은 조, 위, 한의 3진 세력이었다. 진왕 정 6년인 BCE 241년 6국 연합군을 함곡관 앞에서 격파하여 합종 책략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고, 이제 동쪽으로 진군하는 일만을 남겨 두었다. 여불위가 집정한 12년 동안 진의 군사력은 크게 신장하여 새로 얻은 영토가 15개 군 이상이었고, 통일의 비전을 제시한 『여씨춘추呂氏春秋』라는 저작물을 만들기도 하였다. 당시 전국시대 말엽에 위나라의 신릉군, 초나라의 춘신군, 조나라의 평원군, 제나라의 맹상군 등 이른바 전국 4공자들이 선비들을 양성하고 식객들을 우대하며 인재등용을 하여 정국을 주도하는 풍조가 있었다. 이에 문화적인 열등감이 있던 진나라에서도 여불위가 식객 3천명을 우대하면서 인재를 모았다. 이는 여불위의 개인적인 영향력뿐 아니라 나날이 커져가는 진나라의 국력과 생기 넘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진나라의 야심찬 희망 때문이었다. 다른 4군자들은 식객들의 호평을 얻어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 했으나, 여불위는 그들의 능력을 빌리고 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통일을 어떻게 하고, 통일 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물로 나온 게 『여씨춘추呂氏春秋』였다. 여불위는 통일이라는 대업을 위해서는 군사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사상과 문화, 교육적인 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통치 방법은 형벌과 덕을 함께 사용하되 덕을 우선하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 점에서 진왕 정과 견해가 달랐다. 진왕 정은 한비자의 엄중한 형벌 이론을 편애하였고 통일 후 진 제국의 통치 이념은 가혹한 형벌에 기초한 폭압적인 통치였다

여불위를 제거하고 역사의 무대에 오르다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오른 진왕 정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국사를 여불위를 중심으로 한 대신들에게 맡겨 처리했다. 하지만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는 법.
진왕 정은 자기주장이 강했고,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으며, 거만하고 난폭한데다 모든 일을 자신의 생각대로 처리하는 인물이었다.
진왕 정과 여불위의 대립은 친정을 시작하면서 폭발하였다. 표면적으로는 태후와 관련된 궁중 추문이 도화선이 되었다. 당시 여불위는 진왕 정의 모친인 진 장양왕의 부인과 사통하고 있었다. 점점 성장하고 있는 진왕 정이 두려웠던 여불위는 노애嫪毐라는 비상한 성 능력을 지닌 남자를 불러들여 자신을 대신하게 했다. 태후는 남의 눈을 피해 노애와 사통하고, 아들을 두기도 하였다. 태후의 총애를 받은 노애의 세력은 점점 커져 마침내는 난을 일으켰지만 이미 철저히 준비하고 있던 진왕 정에 의해 진압되었다.
(주5)
이 사건은 여불위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사람을 잘못 추천한 것인지, 태후와 사통한 행각 때문인지 사서에서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당시 전국시대에 태후나 공주가 공개적으로 사통한 일은 많았다. 대표적으로 진왕 정의 고조모 선태후 역시 서북 지역의 의거왕義渠王과 사통하여 아들을 둘이나 낳았고, 한 소제漢昭帝의 손위 누이도 정외인丁外人이라는 사통하는 이를 거느렸다. 어찌 보면 남자들이 첩을 두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무튼 노애의 난으로 여불위는 면직되어 쫓겨났고 얼마 후 진왕 정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 독주를 마시고 자살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음탕한 태후와 그의 총애를 받은 노애 그리고 전 애인 여불위’로 인해 대규모 숙청이 일어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진왕 정 자신이 ‘백성들을 혼자 다스리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권력욕이 자리하고 있었다. 진왕 정은 이겼다. 친정을 한 지 2년도 안 되어, 여불위와 노애 같은 큰 세력을 일거에 제거한 뒤 진나라의 권력을 한 손에 완전히 움켜쥐고 역사의 무대에 올랐다.
진왕 정은 역사적인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었다. 선대왕들이 쌓아 온 물리적인 힘과 진나라 정치의 향방을 결정하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다. 이제 역사가 그에게 부여한 임무는 바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수중에 있는 물리적인 힘으로 방대한 규모의 전쟁을 일으켜 6국 통일을 실현시키는 것이었다. 진왕 정은 그런 일을 수행하기에 제격인 뛰어난 인물이기는 하였다. 그는 매우 근면한 군주로 결재서류의 무게를 달아 밤낮으로 결재해야 할 양을 정하고 이를 처리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 워커홀릭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절대 권력자의 이런 모습에 백관들이 감히 나태할 수 있을까? 훗날 진왕 정을 비판하는 이들도 그의 사치향락이나 음탕한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 그럴 만한 일도 거의 없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일지 모른다.
진왕 정은 자기의 근면을 내세워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어 갔다. 여기에 진왕 정은 인재를 대함에 있어 국적이나 출신 성분, 빈부귀천 등을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어질고 현명하기만 하면 등용하는 진나라의 전통을 중시하였다. 그를 보좌한 왕전王翦, 왕분王賁, 위료尉繚, 이사李斯, 요가姚賈, 돈약頓弱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진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진나라를 위해 온 힘을 모아 적을 이기기 위한 정치 책략과 군사 계획을 만들고 자신들이 직접 실천에 옮겼다. 진왕 정은 이들이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진왕 정은 과감하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는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역사에 나타난 유아독존적 이미지는 통일 이후의 모습이다. 그 이전에는 간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바로잡는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진왕 정의 6국 통일을 위한 첫걸음은 먼저 한나라를 향했다. 지리적으로 진나라와 가까웠을 뿐 아니라 국력이 가장 약했기 때문이다. BCE 230년 한왕 안安을 지산吱山에 안치하고 한나라 영토에 영천군潁川郡을 설치하였다. 이듬해인 BCE 229년 진나라는 주력군을 정비하고 명장 왕전의 지휘 하에 조나라를 공격하여 BCE 228년 조나라 수도 한단을 함락시키고 조왕을 포로로 잡았다. 실로 욱일승천하는 기세였다.
진왕 정을 암살하라!
BCE 227년 바람이 소슬하게 부는 어느 날. 진나라 정궁 함양궁咸陽宮은 온통 기쁨에 싸여 있었다. 조복朝服을 차려입은 진왕 정은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방금 막 도착한 두 명의 사신을 정중하게 영접하고 있었다. 두 명의 사신들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선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순식간에 살벌한 광경으로 바뀌면서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극이 되어 버렸다. 연나라에서 보낸 두 명의 사신은 정사인 형가荊軻와 부사 진무양秦舞陽이었다. 사실 이 둘은 진나라를 배신하고 연나라로 망명한 장군 번어기의 목과 연나라 영토인 독항 지역(지금의 허베이성河北省 구안현固安县과 줘저우시涿州市 일대의 비옥한 땅) 지도를 가지고 오는 것을 미끼로 하여 진왕 정을 암살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객들이었다. 이들을 사주한 사람은 연나라 태자 단丹이었다. 조나라 멸망 이후 진나라의 군세는 역수易水까지 이르러 연나라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본래 태자 단은 조나라에 이질로 잡혀 있었을 때 그곳에서 태어난 진왕 정과 함께 어울려 놀며 지냈었다. 이후 진왕 정이 진나라 왕이 되었을 때 태자 단은 진나라의 인질이 되었다. 그때 고국을 보내주길 원한 태자 단의 뜻을 진왕 정은 외면하였다. 이에 원한을 품은 태자 단은 풍전등화와 같은 연나라의 운명을 걸고 진왕 정 암살에 모든 것을 거는 모험을 감행했다.
이날 형가는 번어기의 목이 든 함을, 진무양은 독항의 지도를 들고 진왕 정 앞에 나서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무양은 위세 등등한 진나라의 위용에 눌려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형가 홀로 지도를 건네받고 진왕 정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독항의 지도를 펼쳐들면서 안에 감춰 둔 비수를 꺼내 들었다. 이 비수는 단조할 때 극독을 넣은 약수藥水에 수차례나 담금질한 제품으로 피가 한 방울만 나더라도 즉사할 수 있도록 만든 무기였다.
당시 진나라 어전에는 왕 이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병장기도 휴대할 수 없었고, 단 아래 호위무사들은 명령 없이는 어전에 올라갈 수 없었다. 그래서 진나라 어전에서는 죽이려는 형가와 도망가는 진왕 정의 숨 막히는 대결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당시 진왕 정에게는 7척 길이의 장검이 있었는데, 이를 뽑을 여유가 없었다. 이때 시의侍醫 하무저夏無且가 손에 들고 있던 약주머니를 있는 힘껏 형가에게 던졌고 형가는 이를 피하면서 잠시 틈이 생겼다. 일순간 숨을 돌린 진왕 정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서 칼을 등에 옮겨 매 겨우 칼을 뽑을 수 있었다. 칼을 뽑아 든 진왕 정은 형가의 왼쪽 다리를 찔렀고 좌우에 있던 신하들이 바로 달려들어 형가를 죽여 버렸다.
진왕 정은 왕위에 오른 이후 함양궁 미행 중 발생한 암살 시도와 천하 순행 중 박랑사에서 장량張良과 창해 역사에 의해 감행된 암살 시도 등 여러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이번 형가의 암살 기도는 바로 눈앞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지옥문 앞에까지 갔다가 살아 나오는 충격과 공포를 안겨 준 사건이었다. 진왕 정의 분노는 연나라의 조속한 멸망으로 이어져 BCE 226년 연의 수도 계성薊城이 진나라 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이듬해인 BCE 225년에는 황하의 물을 대량으로 끌어 모아 위나라의 수도인 대량을 수공법水攻法으로 파괴하여 멸망시켰다.
진나라는 나라의 역량을 집중하여 이웃 나라의 수도를 순식간에 함락시키는 방식으로 6국을 하나씩 멸망시켜 나갔다. 중원의 나라들을 멸망시킨 진의 창끝은 남방의 초나라로 향했다. 초나라는 북으로는 황하, 남으로는 지금의 푸젠성福建省과 광둥성廣東省 일대인 민월閩越, 동으로는 지금의 저장浙江, 서로는 파촉巴蜀 땅 일대까지를 차지하고 있어 땅 넓이만으로는 전국칠웅 중 단연 최고였고, 서초패왕 항우의 할아버지인 항연項燕이 버티고 있었다. 그래서 진나라는 나라 안이 텅 빌 정도인 60만 대군을 동원하여 지구전을 폈고, 기회를 보아 초나라 도성인 수춘壽春(지금의 안후이성安徽省 서우현壽县)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고 진나라 군은 초나라 왕 부추負芻를 사로잡았다(BCE 224년). 파죽지세였다. 하나 남은 제나라는 싸움도 하지 않고, 제나라 수도 임치를 기습한 상태에서 제나라 왕이 항복을 하였다. 이로써 6국 통일의 중원 통일 대업이 완성되었다. 진나라 건국 후 약 500년이 지난 BCE 221년이다. 진나라에 의한 중원통일은 진왕 정 이전 선대왕 때로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온 변혁 정책의 총체적 결과물이었다.
6국 평정 후 진시황의 업적
중국 역사는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는 영토 분쟁으로 겹겹이 포개져 있다. 20세기 초 중국 역사학자 후스胡適는 “기원전 841년 이전의 중국 역사는 못 믿겠다”고 선언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사의 첫머리로 꼽는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는 황제부터 하, 상, 주나라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하면서 정확한 연도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나라 제18대 마지막 려왕勵王의 폭정에 민란이 일어나 왕이 축출되어 대신들이 다스리던 BCE 841년 공화 원년부터를 중국의 역사라고 여겼다. 이 시기부터 보면 중국이 정식으로 통일되던 기간은 1,374년으로 전체 역사의 반도 안 되는 시기였다.
처음으로 중국을 중국답게 통일한 제국이 진秦나라로 BCE 221년 진왕 정이 중원을 통일하여 제국의 시대를 열었다. 진왕 정은 이전의 왕들과 자신을 구별하여 황제皇帝라는 호칭을 사용한 최초의 황제, 시황제始皇帝가 되었다. 진나라와 그 뒤를 이은 한漢나라는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밀접하여 진한제국이라 말한다. 이 진한제국은 현재의 중국을 형성하게 한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을 구성하는 56개 민족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의 뿌리이기도 하면서 중앙집권체제의 기틀과 화폐, 토지개혁을 통한 경제적 부흥의 초석을 다지기도 하였고, 여러 법제의 기초가 마련된 시기이다. 춘추 전국시대의 난세를 겪는 동안 사람들 마음속에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싹트고 있었다. 그중 최초로 중국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는 유교의 아성亞聖 맹자孟子였다 그는 천하는 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천하가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평화를 맞이할 수 있다는 대일통大一統 사상을 주장하였다.
황제가 되다 진왕 정은 33세 때 형가의 암살미수 사건을 겪고, 마침내 39세에 중원을 통일하였다. 통일은 그에게 새로운 무대를 열어 주었고 거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했다. 진왕 정은 자신만만한 자세로 만인을 굽어보며 통일 후 첫 번째 정책을 취한다. 그것은 스스로를 황제라 참칭僭稱하는 것이었다. 전국시대 이전의 제帝는 지극히 높은 신(至上神)을 가리키는 말로 하늘과 인간, 사회와 자연의 최고 주재자를 칭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상고시대 기록을 보면 상제님(帝)의 명으로 비를 내린다, 바람을 불게 한다는 기록들을 보게 된다. 황皇은 본시 제帝의 형용사였고, 후에 군주의 칭호가 되었다(황皇에는 하늘이 낸 사람의 통칭이라는 의미도 있다). 황은 셋으로 흔히들 복희씨, 여와씨, 신농씨를 가리키며 본래 동방의 성왕聖王들을 말하고, 제는 다섯으로 황제, 전욱, 제곡, 요, 순으로 중국 민족을 지도한 왕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그래서 사마천의 『사기史記』에는 본래 삼황에 대한 기록은 없고, 오제본기五帝本紀부터 시작한다). 이들은 상당히 훌륭한 인품을 지닌 군주의 모범으로 여겨졌다. 흔히 삼황오제라 일컬어지는 이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왕의 자리를 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진왕 정은 이들의 공업을 능가한다 하여 스스로를 황제라고 참칭하게 된 것이다. 진시황이 자신의 호칭과 관련한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자신의 명분을 바로 세우는 정명正名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논어에 나오는 정명 사상이 바탕이 되었다. 논어 자로편에서 공자는 “명분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일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악이 흥성하지 못하게 된다. 예악이 흥성하지 못하면 형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어진다”고 하며 명분을 바로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황제, 짐, 조서 등의 용어는 자신의 신격화와 신성화를 이끌어 냈다. 황제를 용龍으로 비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시황은 자신이 천하제일의 지존이라는 사상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정명, 신격화, 신성화 등)은 현실 정치를 강화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천하가 자신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군주의 행위를 평가하는 시호법을 폐지하여 스스로를 처음이란 의미로 시始황제라 칭하였다. 이후 황제는 2세, 3세라 칭하기로 했는데 3세만에 진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또한 진시황은 황제와 관련된 특별한 글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한 피휘避諱제를 시행하였으며, 나라의 상징을 오행 법칙에 따라 물(水)로 정했다.
(주6)
군현제와 중앙집권 관료체제(정치 행정적인 면) 진시황은 전국을 군현으로 나눠 철저한 중앙집권제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완비된 행정기구와 이에 상응하는 관료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했다. 이 둘은 황제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였다. 즉 전국을 등급에 따라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황제가 파견한 관리가 황제를 대신하여 직접 다스렸다. 이로써 정치적 권한을 황제에게 고도로 집중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진나라는 내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승상丞相(政), 최고 군사장관으로 태위太尉(國尉,軍) 그리고 감찰장관인 어사대부御史大夫(監察)를 두었다. 중앙기구로 이 삼공을 설치하되 서로 독립적인 기구로 최후의 결정권은 황제에게 두어 권력이 집중되도록 했다. 또한 조정의 조직체제에는 황실의 사사로운 업무와 국가의 공적 업무가 함께 뒤섞여 있게 하였는데 이는 가천하家天下적 황제체제의 기본 특징이었다.
여기에 지방은 군과 현의 두 등급으로 나누어졌고 조정에서 임명된 관리가 황제의 의도를 각계각층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선 주나라 천자도 진시황과 같이 이름은 천하의 주인이었지만 실제 다스리는 영역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차이로 진 제국은 중국 역사상 일대 분수령을 이룬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진 제국이 두 세대 만에 멸망하였지만, 제도는 그대로 한나라로 계승 발전되었다. 군현제는 상, 주 이래 줄곧 시행된 분봉제를 종식시켰고, 이에 따라 제후가 각기 주관하는 정치 국면도 막을 내렸다.
전국 도로망 정비 진시황은 천하통일 이후 여러 측면에서 다른 ‘통일’의 업적을 세운다. 우선 중국이라는 개념을 확립시켰다. 중국의 영문 번역이 차이나 China는 바로 진秦을 음역한 것이다. 지리적 정치적 통일을 바탕으로 경제와 문화 영역에서도 통일을 촉진하였다. 진시황은 전국 교통 발전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 수레의 양쪽 바퀴 사이의 거리를 통일하고, 천자의 전용도로인 치도馳道(도로 넓이 50보)를 건설하였으며, 북으로 향하는 직도直道와 촉한 지역으로 가는 오척도五尺道(폭 5척 도로)와 동남쪽으로 직통하는 신도新道를 건설하는 등 함양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통하는 교통망을 구축하였다.
화폐 및 도량형 통일과 문자 통일(사회 경제적인 면) 그리고 모양과 관리가 제각각인 화폐를 진나라의 진반량秦半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도량형(도度는 길이, 양量은 부피, 형衡은 무게를 의미한다)을 통일하였다. 명칭과 단위, 쓰임새 등을 통일하였다. 도량형은 계량의 도구일 뿐 아니라 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일종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도량형의 표준을 확립하는 일은 왕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중요한 시책이었다. 이와 함께 진시황은 문자를 정리하라는 명을 내렸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진나라 법정 서체를 소전小篆체(현재 인감도장으로 주로 사용되는 서체)를 기본으로 예서隸書의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이었다. 진왕조의 문자 규범화는 단지 알기 쉽고 쓰기 쉬운 문자로 통일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자 정형의 기초를 다진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각 지방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지방간 원활한 교류가 가능해졌으며, 정부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었고, 통일된 문자는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진시황이 직접 정사를 돌본 시기에는 줄곧 모든 게 순조로웠다. 중원을 통일했고, 새로운 정치 개혁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고, 일련의 통일 정책은 중국 2천 년 정치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진시황의 공과 진시황은 천하의 모든 일을 직접 결정하였고, 공문서를 무게로 계산하여 매일 밤낮으로 자신이 처리할 문서의 양을 정해두고(呈), 정해진 양에 차지 않으면 쉬지도 않았다고 한다. 당시 상주된 문서는 죽간이었을 것이고 그 문서의 상당한 양은 1일 1석(120근, 1근=250g)이었다고 한다. 이런 근면함은 그를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의 반열에 오르게 했다. 그러나 이런 진시황의 위대한 업적 이면에는 중대한 과오도 함께 수반되었다. 즉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進攻)에서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쪽(守成)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통일을 실현하고 나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전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조정이 없었다. 전쟁 시기에는 적국의 인적자원을 파괴하기 위해 그들을 핍박하고 적국의 물질을 빼앗아서 스스로 강해져야 했다. 이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나라가 통일제국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분열된 6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형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었다. 과거 대적하던 관계는 통일된 제국 내에서는 다양한 관계로 변화했다. 계급간의 대립이나 서로 다른 집단과 다른 계급간의 이익 대립이 있는가 하면, 서로 공존공영하고 의지해야 하는 관계가 필요하기도 했다. 진시황은 이런 관계를 잘 조정하여 안정된 사회 질서를 건립하였어야 했다. 하지만 진시황은 이런 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 거의 없었다. 통일 후에도 전쟁 시기와 변함없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였고, 다양한 관계의 조정에는 힘쓰지 않았다. 진시황은 백성들의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잔혹하게 억압하여 그들의 비난을 샀다. 근본적으로 그의 통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통일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는 시대의 명에 따라 이를 충실하게 잘 따랐지만(順天), 통일 이후에는 덕을 바탕으로 한 인정仁政을 펼쳤어야 했으나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고 가장 중요한 민심을 잃고 말았다(逆民).
진시황은 백성의 노동력을 남용하여 북으로는 만리장성 건설을 위해 30여 만 명의 백성을 동원했고, 남으로는 백월을 정벌한 후 오령五嶺을 수비하는 데 50여 만 명을 파병했다. 아방궁 건립
(주7)
과 여산驪山에 능을 건설하는 데에는 70만 명을 징발하였다. 이에 도로. 교량 등의 건설에 동원된 총 인력은 200만 명에 달했다. 당시 전국 인구 2천만 정도였는데 약 10분의 1 정도가 스스로 도구와 식량을 준비해서 국가의 노역에 종사했으니 그 부담이 막중하기가 실로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다. 또한 진나라 법의 가혹성은 역사상 보기 드문 것이었다. 그 중 하나를 들어보면 진시황 36년 동군東郡 경내에 운석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진시황이 죽으면 나라는 분열된다는 저주의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에 진시황은 진상을 조사하지 않고 운석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 버렸다. 진나라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죽게 되거나 가족이 멸문하는 재앙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었다. 진나라 멸망의 서막인 진승, 오광의 봉기 역시 이들이 큰 비로 규정된 시간에 지정된 노역 장소로 갈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봉기를 일으킨 것이었다. 도망가도 죽고 늦게 가도 죽으니 봉기라도 일으켜 보자는 심산이었고, 한나라 고조 유방도 이런 봉기군의 일원이었다.
진시황의 최후
왕王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라면 지상의 제帝는 나라가 아닌 천하라는 개념을 다스리는 존재이다. 국경에 의해 제한되는 통치자는 국경 밖 다른 나라에는 ‘또 다른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존재한다. 이런 국경이라는 개념이 배제되는 천하의 일인자로 인식한 진시황은 상제님이 수레를 타고 천극天極을 순회하는 것처럼 천하를 순시하기로 하였다. 통일한 다음 해부터 온량거轀輬車(작은 창을 열고 닫으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되는 상자 형태의 수레)를 타고 천하를 순회하였다. 그는 순시하면서 경치를 즐기며 유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면서 민심의 동태를 살피고 관찰하였다.
진시황은 통일 후 10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시하면서 가는 곳마다 “진시황의 덕을 찬양하고 의기양양함을 밝힌다”는 비문을 새겨 놓았다. 이런 비문들은 진시황의 득의양양한 기세를 충분히 드러내 준다. 하지만 말년의 진시황은 대단히 우울한 생활을 보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진시황이 즐겁지 않다”, “진시황이 묵묵히 있다.”, “진시황이 화를 내다” 등의 심경 변화를 나타내는 기록들이 자주 보인다. 정작 진시황을 가장 심란하게 한 것은 죽음에 대한 예감이었다. 말년의 진시황은 자신에게 닥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불사의 신선이 되기 위해 단약丹藥(일반적으로 외단에서 사용하는 단약에는 수은과 납 성분이 들어 있어 수은 중독, 납 중독의 위험이 있었다. 도교가 성행한 당나라 때에는 이런 단약을 먹고 죽은 황제가 꽤 있다)을 복용하였을 것이고, 장생불사의 약을 구하기 위해 방사인 서불徐市(서복徐福)을 어린 남녀 아이들과 함께 동방으로 보내기도 한다(이때 서불 일행이 도착한 곳이 제주도 어귀로 서불이 돌아갔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 서귀포西歸浦이다). 아마도 진시황은 동방 단군 조선에서 수련의 묘법과 생명 연장의 비법을 배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모든 노력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고, 시황제가 죽을 것이라는 소문이 전국에 떠돌아다녔다. 이는 민심 이반의 징조를 보여 주는 것이고, 시황제의 죽음은 곧 진나라가 멸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결과로 분서焚書와 갱유坑儒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진시황 37년 BCE 210년 시황제는 마지막 순행을 떠난다. 이 유람에 막내아들 호해胡亥를 데리고 갔다. 이것은 그가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진 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운명의 전주곡이었다. 진시황 일행은 10월에 출발하여 11월 운몽에 도착하여 배를 타고 강을 따라가면서 적가籍柯를 돌아보고 해저海渚를 건너 단양丹陽을 지나 전당錢塘을 거쳐 절강浙江에 도달했다. 강을 건넌 다음에는 회계會稽로 가서 오나라 땅을 거쳐 돌아가 북쪽의 낭야琅琊에 도착했다. 다시 낭야로부터 서쪽으로 순행한 시황제 일행이 평원진平原津을 건너 황하를 건넜을 때 드디어 진시황은 병이 들고 말았다. 말없이 서쪽으로 이동하던 중 사구沙丘의 평대에서 세상을 떠났다.
병세가 악화된 시황제는 장자인 부소扶蘇에게 편지를 써서 함양으로 돌아와 장례를 주관하라고 했다. 생전에 태자를 책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미는 부소가 후계자임을 명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옥새를 관장하던 중거부령中車府令 조고趙高의 주도하에 음모가 진행되었다. 승상 이사, 호해에 의한 음모는 마침내 성공하였다. 장자 부소는 자결하고, 진시황의 뒤를 이은 호해는 진시황의 과오를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극단으로 몰고 갔다. 이후 일어난 반진反秦 세력 중 하나인 한고조 유방에 의해서 BCE 206년 함양이 함락되고 초왕 항우에 의해 이미 투항한 3세 자영子嬰이 죽으면서 진나라는 멸망하였다. 진시황 사후 3년이 지났을 때였다.

진시황의 인생사는 100여 년 뒤 사마천이 기록한 『사기』에 남아있다. 이미 1세기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황제는 전설 속 인물이 되었다. 역사적 진실에서 멀어진 다양한 이야기가 생긴 이유는 그가 중국 역사상 최초의 황제이자 최초로 통일된 제국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진 제국은 대륙 서쪽에 위치한 진나라가 그 동쪽에 위치한 여섯 나라를 정복한 결과 탄생한 것이지만, 불과 15년 만에 잔존한 유민 세력에 의해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런 탓에 시황제를 ‘폭군’ 으로, 혹은 ‘유능한 군주’로 평가하는 양 극단의 평가가 내려졌다.
진시황에 대해 폭군이라는 평가가 생긴 이유는 과도한 군사 및 노동력 동원으로 인한 백성들의 반발에서 찾을 수 있다. 장수한 다른 왕조의 경우를 보면 오랜 전란이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 그간 전란에 지친 백성들을 쉬게 하고 노동력 징발을 자제하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어진 정치를 통해 내부 통치를 공고히 하는 데 반해, 진시황은 대규모 군사행동과 대형 토목공사를 끊임없이 추진하였다. 북으로 흉노와 대치하고 남으로 남월을 공략하는 등 계속된 전시체제는 백성들을 지치고 고통스럽게 했다. 거기에 만리장성이나 직도, 치도 등의 방대한 토목공사와 지배계층이나 향유가 가능했을 호화, 사치의 대명사인 아방궁 신축, 능묘 조성 등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즉 오랜 전쟁에 시달려온 백성들은 평화와 행복한 삶을 염원하였는데, 정작 통일된 제국이 백성에게 가져다 준 것은 과중한 조세와 부역, 가혹한 형벌과 굶주림뿐이었다. 아마 백성들은 나라 전체가 캄캄한 감옥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여기에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권력의 권權 자는 ‘저울추’ 권으로 힘의 저울, 즉 힘의 균형된 분배를 뜻하는데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할 권력이 특정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예상치 못한 위기를 불러왔다. 그래서 진시황의 급작스런 사망과 2세 호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리더십 공백이 생기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버린 것이다.
시대는 영웅을 낳고 영웅 또한 시대를 만든다. 시대는 진왕 정에게 6국 통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았고, 진시황은 이 무대 위에서 성공적으로 6국 통일의 웅장한 연극을 연출해 냈다. 그렇기에 진시황을 ‘폭군’이라는 두 글자로만 규정하는 건 일종의 모욕이 될 것이다. 그가 폭군의 이미지를 뒤집어쓰게 된 건 집권 후반기의 여러 실책들로 인해 진나라가 너무 쉽게 망해 버렸기 때문이다. 진시황이 이루어 놓은 것들 중 영토, 도량형, 문자, 화폐의 통일만으로도 그를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로 평가할 여지는 충분하다. 하-상-주로 이어지는 유가문화 전통을 겉옷으로 치장하고 진나라의 법가 통치술을 속살로 채워 넣은 것이 유방이 세운 한나라의 문물제도인데, 이것은 이후 청나라 때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지금의 중국인들이 항상 염두에 두는 통일의 관념을 최초로 구체화시킨 인물이 진시황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진시황과 만리장성萬里長城 그리고 분서焚書 갱유坑儒 사건
진시황은 그 위대한 공적만큼이나 과실도 분명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으로 갈린다. 명말 학자인 이탁오李卓吾는 진시황을 가리켜 “천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황제(千古一帝)”라고 했으며, 청말 학자인 담사동譚嗣同이나 모택동은 “지난 이천 년의 모든 왕조가 진나라를 모방했다(兩千年之政皆秦政也)”라고 극찬하기까지 했다.
반면 중국 역사상 많은 군주들은 전대의 과실을 잊지 말고 오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대표적 인물로 진시황을 언급하였다.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사건들이 비판의 소재였는데, 여기서는 만리장성과 분서갱유 사건을 통해 진시황에 얽힌 오해와 의혹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만리장성萬里長城
진시황 32년인 BCE 215년, 통일 이후 평화의 시대는 종언을 알리게 되었다. 북방 흉노족과의 치열한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진시황은 장군 몽염에게 30만 대군을 주어 산시성 북부의 초원지대인 하남(오로도스Ordos 지방) 지역을 빼앗고 황하 변경에 보루를 설치하였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성새, 만리장성을 쌓게 된 것이다. BCE 214년 진시황 33년 흉노족에게 공격을 개시하였고 34년인 BCE 213년에 장성 축성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BCE 210년 만리장성은 4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있던 연, 조, 진나라는 북쪽 흉노의 남하를 막기 위해 장성을 축조하고 있었다. 통일을 이룬 후에도 북방의 흉노는 여전히 큰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진시황은 기존 장성을 보수하거나 하나로 연결하였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간쑤성甘肅省 민岷현 일대인 임조臨洮에서 시작해 하란산賀蘭山, 음산陰山을 따라 동으로 ‘고古’요동에 이르는 1만 리 장성의 기본 골격이 완성되었다.주8
이후 진을 계승한 한나라에서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조는 이를 보수, 증축하면서 신경을 많이 기울였다. 현재 보는 장성은 대체로 명나라 때 것으로 원래의 진 장성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온 것이다. 만리장성은 하나의 긴 담 개념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뚫리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전략적으로는 무용지물이 되는 비효율적인 군사 방어 시스템이었다. 단지 장성의 남쪽은 모두 중국이라는 관념이 생겨났으며, 만리장성은 중국 한족을 동방과 북방의 민족과 구분 짓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통일 전쟁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해 이렇게 거대한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진시황의 통치 행위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당시 진나라는 그 자체가 거대한 공사판과 같았으며, 진시황은 한마디로 각종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미친 황제라고 평하는 것이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아무튼 진시황의 여러 역사적인 공헌은 종종 역사에 길이 남을 죄악과 일란성 쌍둥이처럼 병존하는 것이었으며, 이런 모순들이 진 멸망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분서焚書와 갱유坑儒
활발한 사상 활동은 사상의 자유에서 비롯되는데 전제적인 정치체제 아래서 그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 전제정치의 본질은 독재이며 ‘모든 일은 권력의 중앙에서 결정한다’는 원칙하에 움직여진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자유로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진시황과 그 후대 제왕들의 행적이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통일을 이룩하기 전에 진왕 정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매우 귀담아 듣는 듯했다. 하지만 통일을 이룩하고 난 뒤에는 천하에서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이 유일한 진리로 여겨지기를 원했다. 이런 사상 통일을 위한 진시황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게 이른 바 분서焚書(책을 불사름)와 갱유坑儒(수많은 유생을 구덩이에 파묻어 죽임)이다. 이 사건은 지난 2천 년 동안 중국 지식인들이 진시황을 비판하는 주 대상이었다. 분서는 진시황 34년 BCE 213년에, 갱유는 진시황이 죽기 두 해 전인 진시황 35년에 일어났다.
사건의 발단은 진시황의 생일날 벌어졌다. 70명의 박사들이 참석한 대 연회에서 수석 박사인 주청신周靑臣은 진시황을 한껏 치켜세우는 등 칭송의 말을 늘어놓았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군주라고 말이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지만, 평소 진시황의 시정 방침에 문제의식을 지닌 제나라 출신 박사 순우월淳于越은 간사하게 아첨하는 주청신을 비판하면서, 제나라가 강태공의 후손으로 이어지다 전씨가 찬탈한 사실을 들면서 진시황의 군현제를 반대하였다. 물론 순우월은 대제국 진나라의 천하가 영嬴씨에 의해 대대로 통치되어야 한다는 충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그렇기에 진시황은 터지는 화를 누그러뜨리며 분봉제와 군현제에 대한 열띤 토론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했다. 현재 다른 의견들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고 오직 승상 이사李斯의 견해만 남아 있다. 이사는 군현제를 지지하는 발언과 함께 옛것을 답습하는 문제와 현실을 부정하는 문제를 함께 연관 지어 옛것을 답습하는 것은 바로 현실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곧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제국의 통치에 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옛것을 따른다는 명분 아래 현행 정책에 반기를 드는 자들을 정권의 힘으로 적절히 제압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여 황제가 되는’ 목적에 비로소 다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분서라는 방법으로 각 나라의 역사서를 불태움으로써 과거 6국의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했다. 즉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던 시詩, 서書, 제자백가들의 어록들을 모두 태워 버리고 백성들이 현재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들을 모두 없애고자 했다. 이를 위반하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건의하였고, 진시황은 이사의 건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얼마 후 이른바 갱유 사건이 벌어진다. 만년의 진시황은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장생불로長生不老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된다. 당시 장생불로의 술법을 수련하고 선단이나 선약을 제련하는 이를 방사方士라고 불렀다. 진시황 28년, 두 번째로 천하 순행을 나선 진시황은 낭야대에서 생애 처음 푸른 바다를 보게 되었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3개월을 머물렀는데, 이곳에서 방사 서복徐福(서불徐巿)을 만나게 된다. 이후 많은 수의 방사가 유입되어 진시황의 기대에 부응하였는데 그 수가 무려 300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진시황이 찾아오라는 선약仙藥을 찾지 못하자, 황당한 이유를 들며 시간을 끌었다. 진나라는 법가를 신봉하는 법치국가로 실효성을 중시하였는데,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노생 등 방사들은 죽은 목숨이었다. 겁이 난 이들은 한꺼번에 도망가 버렸다. 이에 크게 노한 진시황은 이 사건을 감찰기구인 어사대에 넘겨 그 책임을 추궁하였다. 이때 주모자급인 후생侯生과 노생盧生은 도망간 이후였고, 다른 방사나 문인, 잡기에 능한 이들이 잡혀 심문을 받았으며, 그 중 460여 명이 유죄 처리되어 함양 동부 외곽 지역에 생매장되었다. 이게 이른바 갱유 사건의 전말이다.
이른바 분서와 갱유를 통해 진시황은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사상을 통일하고 여론을 장악하였다. 하지만 이 분서갱유의 후폭풍은 더 심각했다. 이 사건들 이후 2,000년간 진시황은 잔혹하고 포악한 독재자라는 소리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다.
여기서는 분서와 갱유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 한다.
분서는 무엇보다 우민화愚民化 정치를 선도하였다. 폭력을 통해 우민화 통치와 여론 장악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우민화 정책은 동서고금을 통해 칭찬을 받은 경우가 없다. 진시황은 박사라고 하는 고급 인재들이 자신의 군현제를 지지해 주기를 희망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치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충돌하자, 진시황은 냉정해졌다. 그러면서 분서라는 장치로 모든 이들의 정치적 입장을 막아 버렸다. 분서는 문화 독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으나, 책과는 상관없는 항우와 유방에 의해 진은 멸망했다. 진정 사람의 계산은 하늘의 계산과는 상대조차 되지 않았다. 우민화정책을 폈으나, 백성들이 모두 제정신일 때 진나라는 망하고 말았다.
분서갱유 사건은 『사기』 <진시황본기>에 처음 등장한 이후 확대 재생산되었다. 하지만 기록을 잘 보면 유학자들을 잡은 것이 아니라, 방사들과 문학 방술사 등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처벌 방식에 있어서도 출토된 다량의 당시 법률문서를 보면 진나라에서는 생매장으로 사형시키는 경우는 없었다. 당시 생매장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악행으로 취급되었다. 생매장 방식은 예외적으로 전장에서만 등장하는데 이 역시도 세인의 지탄을 받게 되었다. 가장 유명한 경우가 진나라 장군 백기가 장평대전에서 승리한 다음 포로 40만을 생매장한 것과 항우가 진나라 포로 20만을 생매장한 것이다. 그만큼 처형의 수단으로 생매장을 택했다는 기록은 당시 법률로 봤을 땐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주모자급은 전부 놓쳤고, 서복은 갱유사건 다음 해인 진시황 37년 다섯 번째 순행 길에서 진시황과 만나게 되지만, 이때 처벌은커녕 서복이 말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를 진시황이 직접 제거해 주는 선처까지 베풀어 주었다. 또한 진나라 이후에 등장한 한漢나라 초기 정치가인 가의賈誼의 『신서新書』와 한 문제에게 진나라의 실패를 언급하며 치국 방안을 조언하였던 가산賈山이 쓴 『지언至言』은 모두 진시황과 진나라의 실패 원인에 대해 언급한 기록들인데, 여기에는 진시황의 여러 실정들 가운데 분서는 언급했지만 갱유에 대해서는 거론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갱유 사건은 아마도 한나라 때 유생들에 의해 조작 확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국시대 인물열전
상앙商鞅
상앙商鞅은 진 제국의 기초를 닦은 법치주의 개혁가이다. 위衛나라 왕실의 후손으로 위앙韋鞅 또는 공손앙公孫鞅으로 불렸다. 일찍부터 형명지학刑名之學에 조예가 깊었던 그는 공숙좌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위魏나라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진秦나라로 건너가서 10년간 재상으로 있으면서 상앙 변법이라 일컬어지는 대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효공의 신임을 받고 농지개혁, 농업 및 양잠 중시, 군공 장려, 도량형 통일 및 군현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변법變法(법률을 고쳐 개혁을 시행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진나라는 전국 시대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공적으로 열후에 봉해지고 상商을 봉토로 받아 성씨를 상商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의 엄격한 법치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으며, 결국 그는 최대 지원자인 진효공이 죽자 반대파들로부터 거열형을 당했다.
소진蘇奏과 장의張儀
소진蘇秦과 장의張儀는 전국시대 말 합종책合縱策과 연횡책連橫策을 제창한 인물들이며, 귀곡자鬼谷子에게 사사한 동문으로 배움은 같았으나 서로 상반되는 외교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했다. 당시 천하는 통일을 주도하려는 진나라와 이를 막으려는 나머지 6국 사이에 첨예한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정책 대결은 진나라와 다른 6국 사이의 대리 외교전이나 마찬가지였다.
합종책은 서쪽의 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동쪽에 남북 방향으로 위치한 나머지 6국(연, 조, 제, 위, 한, 초)이 종적(남과 북)으로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정책이고, 연횡책은 동쪽의 6국들이 연합해 진나라에 대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나라는 6국을 따로 흩어 놓고 6국과 개별적으로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정책이다.
소진은 진나라에 들어가 연횡책을 펴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연나라로 가서 합종책을 추진했다. 그는 진나라를 두려워하는 6국을 설복하는데 성공하여 BCE 333년 남북으로 6국 합종에 성공했다. 그러나 자신의 합종책이 깨어질까 염려하던 소진은 계략을 써 장의를 진나라로 보내어 긴장상태를 유지하게 했다. 또한 소진이 있는 한 조나라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장의 덕분에 십여 년간 권세를 누렸다. 그러나 진이 중원으로 진출하려면 조나라를 치는 게 불가피했으므로 진은 조나라와 합종하고 있던 위나라와 제나라를 설득하여 조나라를 공격했고, 합종책은 깨지고 말았다. 그 후 소진은 연나라의 관직에 있다가 다시 제나라에 출사했으나 대부의 미움을 사 암살당했다.
장의 역시 초나라로 유세를 떠났으나 자신의 뜻을 펴 보지도 못한 채 벽옥으로 만든 의기儀器를 훔친 혐의를 받아 태형을 받고 추방되었다. 그러나 그는 제후들을 찾아다니며 유세를 계속했고 마침내 소진의 주선으로 진나라에서 벼슬살이를 하게 됐다. 진 혜문왕惠文王 때 재상에 오른 그는 6국을 설득하여 진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관계를 맺게 했다. 그러나 혜문왕이 죽은 뒤 실각하여 위나라로 피신했으며 재상이 된지 1년 만에 죽었다.
왕전王翦과 왕분王賁
왕전王翦과 왕분王賁은 부자지간이며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진나라 명장들로 왕전은 백기白起, 염파廉頗, 이목李牧과 함께 전국시대 4대 명장으로 꼽힌다. 두 사람의 전략과 전술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뛰어났다고 한다. 이들의 활약으로 진나라는 통일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
왕전은 BCE 229년 조나라 수도 한단을 함락하고 조왕을 사로잡았고, BCE 223년 남방의 강대국인 초나라를 멸하였다. 초나라로 출병하기 전 진시황은 왕전에게 얼마의 병력이 필요한지 자문을 구했다. 이때 그는 60만 명의 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진시황은 20만이면 충분하다고 말한 이신을 총사로 삼아 초나라를 공격하게 했으나, 초군에게 대패하였다. 이에 진시황은 왕전을 다시 불러 60만 대군을 주어 초나라를 치게 하였고, 마침내 초나라를 얻게 되었다. 이에 무성후武成候에 봉해졌다.
왕분은 황하의 물을 끌어들여 위나라의 수도 대량을 함락시켰고 BCE 222년 요동을 공격하여 연왕 희를 사로잡았으며, 곧바로 제나라를 기습 공격하여 제왕 건의 항복을 받아냈다.
몽념蒙恬
몽념蒙恬은 진나라 명장으로 아버지인 몽무와 함께 통일 진 제국을 만든 일등 공신이다. BCE 221년 제나라를 멸망시킬 때 큰 공을 세웠다. BCE 214년 북방 흉노족을 격파하고 만리장성을 축성하면서 북쪽 변경을 방어하는 총사령이 되었다. 당시 진 제국 최강군 30만을 지휘하였다. 이때 진시황의 장자인 부소와 함께 상군에 주둔하였다. 진시황 사후 환관 조고와 승상 이사의 흉계로 자결하였다.
이사李斯
이사李斯는 진나라의 대표적인 법가 사상가이자 정치가이다. 초나라 상채上蔡에서 출생하였고 한비자와 함께 순자苟子에게 사사하여 법가 사상을 공부하였으나, 순자의 인의설仁義設에 회의를 느끼고 그를 떠나 진나라로 건너갔다. 그는 승상 여불위에게 발탁되어 낭에 임명되었으며, 후에 진시황이 축객령을 내려 다른 나라에서 온 인재들을 내쫓으려 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간축객서諫逐客書를 올렸다. 이것으로 진시황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진시황의 통일 대업을 보좌하여 승상까지 지냈다.
6국을 통일한 후에는 군현제, 도량형과 문자 통일 등의 정책을 입안했으며, 분서와 갱유에 관여하였다. 이사는 진시황 사후 환관 조고에게 설득되어 막내아들 호해胡亥를 2세 황제로 옹립하고 장자인 부소와 장군 몽념을 자결케 했으나, 얼마 후 조고의 참소로 투옥되어 함양의 시장터에서 처형되었다. 정치적으로는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권모술수에 능하고 시기심이 많아 동문인 한비자를 죽이기도 하였다.
조고趙高
조고趙高는 진시황이 곁에 두고 부리던 환관으로 진나라를 멸망으로 몰고 간 간신이다. 일류 서예가이면서 법률전문가였고, 무예가 뛰어났으며 행정처리 능력도 빼어난 인물이었다. 진시황이 순행 도중 병사하자, 승상 이사와 짜고 거짓 조서를 꾸며 부소와 몽념을 자결케 한 뒤 호해를 2세 황제로 옹립하고 내정을 다스리는 중승상 자리에 올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이후 호해의 이복형제들을 죽이게 했으며 BCE 208년 호해에게 참소하여 이사를 처형시키고 승상이 되었다. 그의 권력에 대한 일화는 ‘지록위마指鹿爲馬’ 고사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BCE 209년 전국에서 모반이 일어나는 혼란한 와중에 2세 호해를 모살하고 자영子嬰을 옹립하였으나, 자영의 계략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노생盧生과 후생候生
노생盧生과 후생候生은 이른바 갱유坑儒의 도화선이 되었던 방사方士들이다. 말년에 불로불사의 신선사상에 도취되어 있던 진시황은 방사와 술사를 가까이 했는데, 그들 가운데 총애를 받던 인물들이다. 노생은 연나라 출신으로 진시황의 명을 받들고 고대의 선인仙人인 선문羨門과 고서高誓를 찾으러 떠났으며, 이듬해에는 바다로 들어가 선인을 찾는 작업을 벌이다 “진을 멸망시키는 자는 호胡이다”라는 예언이 적힌 지도를 가지고 왔다고 전해진다. BCE 212년 진시황의 폭정과 성정을 비판하고 자취를 감췄고, 이에 노한 진시황은 방사와 술사 460여 명을 생매장했다고 한다.
<참고문헌>
『증산도 도전』 (대원출판, 2003)
『역주본 환단고기』 (안경전, 상생출판, 2012)
『사기 본기』 (정범진 외, 까치, 2014)
『사기 열전 상』 (정범진 외, 까치, 2002)
『아틀라스 중국사』 (박한제 외, 사계절, 2008)
『종횡무진 동양사』 (남경태, 그린비, 2013)
『진시황 강의』 (왕리췬, 홍순도, 홍광훈 역, 김영사, 2013)
『중국 고대사 최대의 미스터리 진시황제』 (쓰루마 가즈유키, 김경호 옮김, 청어람미디어, 2004)
『진시황의 비밀』 (리카이위엔, 하병준 옮김, 시공사, 2010)
『제국의 탄생과 몰락』 (중국 CCTV원작, 김원동 편저, 퍼플카우, 2013)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 (주학연, 문성재 역주, 우리역사연구재단, 2009)
『진시황 평전-위대한 폭군』 (천징, 김대환, 신창호 옮김, 미다스북스, 2002)
『이인호 교수의 사기 이야기』 (이인호, 천지인, 2007)
주1.
오래 전부터 진나라가 중국 한족이 아닌 북방 유목민족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중국인 주학연 박사의 저술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사기 진 본기에 나오는 기록을 바탕으로 가축을 방목하고 말을 기르는데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는 유목민족임을 강조하고 있다.
진시황의 증조부인 소왕의 모친인 선태후가 의거왕과 사통했다는 기록을 들어 유목민족은 대체로 성性 문제에 관대했다는 점을 들었다. 사기 상군 열전에 따르면 상앙은 당시 진나라의 습속에서 부자가 한 방에서 지낸다는 표현으로 난륜을 완곡하게 비판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진나라 선조는 사기 진본기 서두에 나오듯이 새(鳥) 토템을 중시하는 민족이었고, 그들의 인명 자체도 융적의 족명을 인명으로 차용했다고 한다.
또한 진나라의 성씨인 영嬴씨는 음가로 볼 때 안安씨이거나 김金씨라고 주장하면서 퉁구스계 김씨 씨족으로 여진족이며 언어는 몽골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테라코타 기법으로 만들어진 진시황 병마용의 얼굴 유형은 퉁구스-여진계나 선비-몽골계 혈통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의미 있는 설이고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2.
성씨姓氏는 혈족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름 앞에 붙이는 표지로 성은 혈족을, 씨는 그 성의 계통을 표시하는 말이다. 성이 먼저 나타나고 뒤에 씨의 구별이 나타난다. 인류의 뿌리 성姓은 태호 복희의 풍風가이나 전해오지 못하고 염제 신농의 강姜가가 성의 시원이다(자세한 내용은 도전道典 2편 37장 참조). 성姓은 글자의 의미로 볼 때, 여자(女)가 낳은 자식(子)들이라는 뜻이다. 모계 씨족사회에서 동일한 모계혈족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였다가 부계사회로 바뀌면서 부계혈통을 나타내는 표식이 되자, 하나의 성에서 갈라진 지파는 새로운 거주지나 조상의 이름 등을 따서 자신들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이를 씨라고 하는데 이런 구분은 하상주 3대와 춘추전국시대를 지나면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부자 사이에도 성은 같지만 씨가 다른 경우가 생기고 성이 다른데도 씨는 같은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성이 같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고, 씨가 같아도 성이 다르면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주3.
6대는 진효공, 진혜문왕, 진무왕, 진소왕, 그리고 진시황의 조부인 진 효문왕과 부친인 장양왕이다. 확실한 기초를 세운 이는 진 효공과 진 혜문왕 그리고 진 소왕이다. 진나라가 대외적으로 이룬 주요한 성과는 주로 이 세 왕의 통치시기에 있었다.
주4.
일각에서는 진시황이 장양왕 자초의 아들이 아니라 여불위의 사생아라는 속설이 있으며, 이는 역사상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기』 <여불위 열전>에는 여불위가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애첩 조희趙姬를 자초에게 주었고, 달이 차서 낳은 아들이 바로 진왕 정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학자들은 대체로 그다지 믿을게 못 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사학자이자 극작가인 궈모뤄郭沫若는 이러한 기록이 사기에만 보이고 전국책에는 실려 있지 않으며 사실 여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다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야기 줄거리가 마치 똑같이 인쇄되어 나온 소설처럼 초나라 때 춘신군과 여환女環의 고사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점과 사기 본문의 기록들이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과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5.
노애의 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있다. 당시 진왕 정이 등극한 후 진나라는 3대 세력이 포진하고 있었다. 즉 진왕 정의 양조모인 화양태후를 위시한 초나라계 외척 세력, 친조모인 하태후夏太后를 위시한 한나라계 외척 세력, 그리고 모후인 제태후帝太后의 조나라 세력이었다. 진왕 정 8년 배다른 동생인 장안군 성교의 난을 진압하면서 한나라계 외척 세력이 숙청되었고, 최대 세력인 초나라계는 이제 조나라계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 이에 제태후와 노애 등의 조나라계는 자기 방어 성격으로 화양태후와 여불위를 제거하기 위해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주6.
진나라는 왕조의 상징으로 오행 가운데 수덕水德을 채택했다. 주왕실을 대신한 왕조로 정통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황제는 토덕으로 이를 극剋한 하나라는 목덕으로, 상나라는 금덕, 주나라는 화덕으로 보고 상극 원리에 따라 나라의 제도를 정하였다. 계절로는 겨울, 숫자는 6, 색은 검은색으로 하여 모든 의복을 검게 하였고, 길이의 기준을 6으로 하였으며 황화를 덕수德水라고 개칭하고 수덕은 음형陰刑을 관리하기 때문에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또한 백성(民)을 검수黔首라는 호칭으로 했는데 이는 검은 머리라는 뜻으로, 관리가 관을 쓸 때에 두발이 노출되는 것을 따왔다고 한다.
주7.
아방궁阿房宮 명은 아성阿城으로 진 혜문왕 때 건설하기 시작했다. 유지遺址는 현 서아시 삼교진 남쪽 거가장 일대에 위치한다. 기록에 따르면 시황제 35년 함양은 인구가 많고 선왕의 궁전은 좁기 때문에 위수 남쪽의 상림원에 궁전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또한 2세 호해 원년인 BCE 209년 다시 아방궁을 축조하였다고 한다. 아방궁 축조 공정은 실제로는 아성, 전전前殿, 궐문의 세 부분으로 조성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전전 유지는 서안시 서쪽 삼교진 남쪽으로, 동으로는 거가장에서 서로는 고성촌古城村에 이른다. 동서로 길이 1,300m, 남북으로 너비 500m, 총 면적 60여 만m²에 달한다. 아방궁에 대해서는 사치했다는 평이 있으나, 완전하게 지어지지 않은 채 불타 버렸기 때문에 그 진상을 알기는 어렵다.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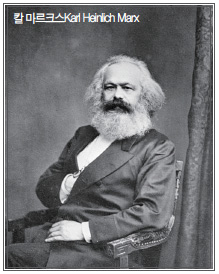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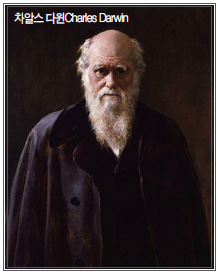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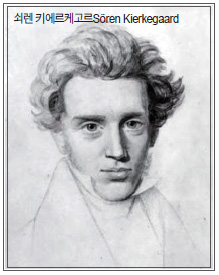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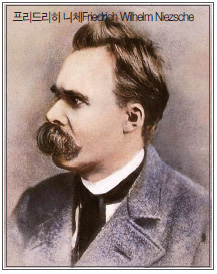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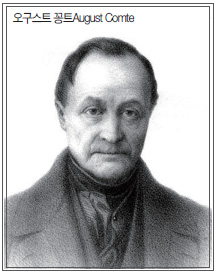 1단계의 시기 :
1단계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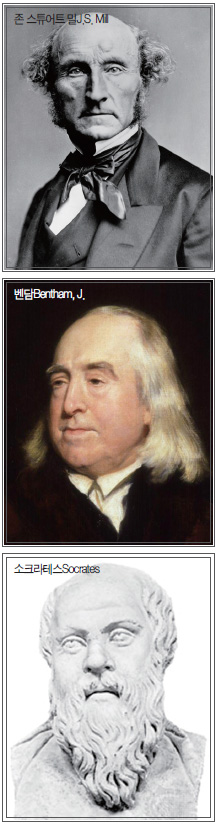
 미국의 정신을 세운 실용주의實用主義
미국의 정신을 세운 실용주의實用主義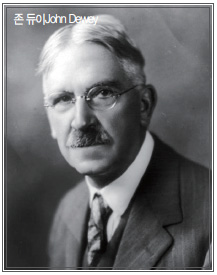
 페히너
페히너



















 1) 합리주의 선구자 데카르트는 누구인가?
1) 합리주의 선구자 데카르트는 누구인가? 







 형이상학적 단자론(monadology)
형이상학적 단자론(monadology)